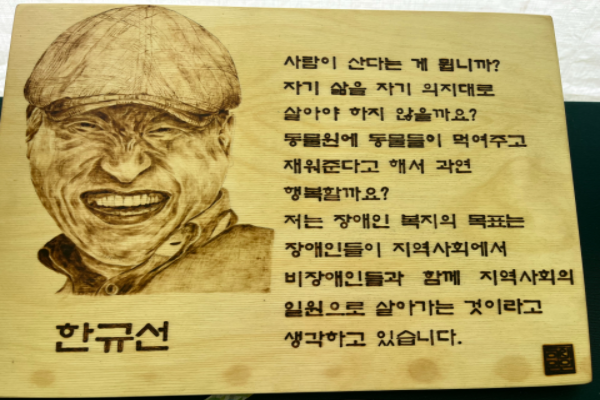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지난달 23일 성동구에서 40대 여성이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모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또 같은 날 인천 연수구에서 대장암을 진단받은 60대 여성이 30대 중증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제적 부담으로 가족이 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을 살해한 후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들은 매년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발달장애인 가족을 추모하기 위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이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 분향소를 마련했다. 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가 “역사 내 승인 없이 시설물 설치는 금지”라며 부모연대 활동가들과 충돌해 약 5시간을 대치했다. 합동분향소는 부모연대와 교통공사 간의 오랜 협의 끝에 지난 26일 삼각지역 1,2번 출구 개찰구 주변에 설치됐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장애인부모연대는 숨진 장애가족을 추모하는 합동분향소를 서울시의회 앞에도 마련해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통과를 위한 투쟁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수십 년간 반복돼왔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장애인 탈시설 관련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분향소는 지난 23일 숨진 발달장애 가족의 49재인 다음달 10일까지 운영된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30일 ‘서울시 발달∙중증 장애인 권리쟁취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열리는 본회의 때 탈시설조례안 통과 △서울시가 발달∙중증 장애인을 24시간 지원하는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등을 요구했다.
탈시설조례의 핵심은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체계를 ‘탈시설 및 자립생활’ 중심으로 변화시킨다는데 있다. 즉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시설장애인을 포함해 지역사회에 사는 모든 장애인의 권리가 폭넓게 보장되는 정책적 근거가 마련된다. 조례에는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원활히 살아가기 위한 △장애인 지원주택 제공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 △공공일자리 제공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정동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국장은 “서울시가 지난해 3월 약속했던 ‘서울시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조례’ 제정을 계속 미뤄왔다. 그 조례가 만약 약속했던 지난해 바로 제정됐더라면 비극적인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서윤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지난달 25일 이번 서울시의회 마지막 회기에서 탈시설조례안를 발의했다. 그 마지막 정례회 본회의가 이달 21일에 열릴 예정인데 이 발의된 조례가 꼭 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언론,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분향소를 마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발달장애인 구성원을 둔 돌봄의 책임이 고스란히 그 가족에게 전가되는 시스템은 우리 모두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문제다. 또 가정 내에서 감당이 어렵다면 결국 시설로 보내질 수 밖에 없는 극단적인 대안책도 안타깝다. 그렇다면 복지수준이 높은 여러 국가 중 호주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어떨까.
호주는 ‘NDIS 국가장애보험’ 정책 아래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NDIS란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a의 약자로 장애인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 평생동안 장애인의 통합과 지역사회에서의 의미있는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 정책이다.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욕구를 사정한 후, 필요한 서비스를 금액으로 산정해 예산을 개인에게 지원하는 형태다. 정부가 지급한 현금 또는 바우처를 이용해 개인이 직접 서비스를 구매해 이용한다.
NDIS는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개인돌봄 △거주지제공 △주택개조 △보조기기제공 △가사도움 △이동지원 △안내견 지원 등 매우 폭넓다. 특히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시대와 공간을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이자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시민으로써의 ‘자립’을 돕는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 제도는 유럽과 북미에서도 채택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 호주 정부에서 정한 NDIS의 예산은 향후 4년 동안 총액 1,200억 달러 이상이다. 한화로 환산하면 연간 약 24조원 이상의 예산이 장애인을 위해 쓰여지는 것. 반면 올해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예산은 약 4조원 남짓이다. 호주의 인구는 한국의 절반 밖에 안 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보면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쉽게 체감할 수 있다.
복지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마땅한 기준을 찾지 못해 난제라면 장애인의 어려움과 결핍, 그리고 니즈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맡겨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당연한 권리를 위해 ‘투쟁’해야만 한다는 현실은 그들만이 감내해야할 서글픔일까. 겪고 있는 장애 그 자체보다 장애인들을 소외시키는 ‘무능한 사회적 제도’를 마주할 때 그들은 더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